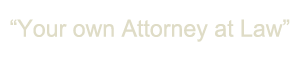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1년 안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 12개월이 넘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첫째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복귀한 A씨는 다시 임신을 해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복귀한 A씨는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1심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을 불승인한 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걸까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지급 ‘소멸시효기간’으로 볼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탓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심은 제107조(소멸시효)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2심의 판단이 대법원으로 이어진다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 급여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폐쇄 조치 과도하면 정당성 상실 (0) | 2017.07.10 |
|---|---|
| 동의 없는 부당 전보는 위법 (0) | 2017.06.09 |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판단기준, 남용행위유형, 처벌) (0) | 2017.06.06 |
| 자전거‧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0) | 2017.06.05 |
| 개최 절차가 잘못된 주총 결의는 유효할까? (0) | 2017.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