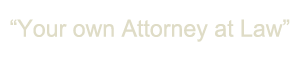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인데요.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05년 2월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6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 임차했던 부분을 계속해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개 > 주목할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0) | 2019.05.27 |
|---|---|
|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유포 해당" (0) | 2019.05.25 |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에 어긋난다" (0) | 2019.04.11 |
| 16년 전 공무원 채용...알고보니 자격증 위조? (0) | 2019.04.04 |
| 누구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 허용하는 '유책주의'란?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