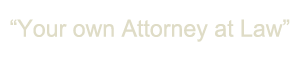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은?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ㄱ씨는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A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9월~2015년 6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가자 2015년 6월 ㄱ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2015년 6월9일 조퇴한 다음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A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지역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했고 한 달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A사에 업무복귀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ㄱ씨는 고용변동 신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이 각하됐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자, ㄱ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는 ㄱ씨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했다며 발생사유란에도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가 안 좋다는 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A사로부터 휴가를 승인 받지 못한 채 15일 가량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사는 ㄱ씨가 고용변동 신고사실을 알게 된 다음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피해를 보는 일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땐,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하신다면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 초기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FAQ(기간, 급여, 대상, 서류) (0) | 2017.01.31 |
|---|---|
| 근로자기준 위약금청구소송을 (0) | 2017.01.20 |
| 성과급 기준 지급규정에 (0) | 2017.01.12 |
| 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0) | 2017.01.10 |
| 임금청구소송 받으려면! (0) | 2017.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