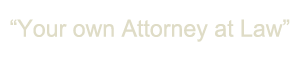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회식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숨진 직원에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를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교육이나 출장, 거래처접대 등도 포함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0년 은행 입사 아래 서울의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점에서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고, 다음날 오전 의식불명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법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죽기 전 피로가 누적된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경험한 통상적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ㄱ씨의 죽음과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틀어 봤을 때 ㄱ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며 ㄱ씨는 발령받는 지점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달성해 다른 직원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이로 인해 계속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탈모까지 생겼으며 최근에는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가졌던 탓에 적지 않은 피로가 쌓여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부터는 협심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지나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러한 것들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공단 측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맨 처음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탄탄한 소송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망 당시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순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0) | 2016.10.28 |
|---|---|
| 해고 무효 판결 소송에서 (0) | 2016.10.25 |
| 특별퇴직금 경쟁사이직으로 (0) | 2016.10.19 |
| 횡령사건 취업청탁을 (0) | 2016.10.14 |
|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0) | 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