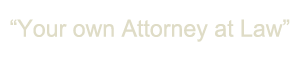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특허 아닌 치료법 보호, 특별한 사정 있어야"
나만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시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모방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닌 경우가 특히 이슈가 많은데요.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허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치료법' 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통증치료법 연구자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했습니다.
ㄱ 씨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습니다.
ㄱ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사는 ㄱ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B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ㄱ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A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ㄱ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B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A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B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ㄱ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허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아이디어, 성과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이용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회사의 독창적인 지적자산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독점적인 권리의 요건들을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끝으로 이번 판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발췌 하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원칙적으로는 물권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달리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정신적·무형적 가치 중 특별히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타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그것이 특정인의 노력으로 발생되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료 행위라 해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유죄 (0) | 2017.12.23 |
|---|---|
| 리베이트 "판매촉진 목적"은 무엇일까? (0) | 2017.12.14 |
| 의료기기회사 주최 시연회에서 시술 받은 후 피부괴사, 의사책임? (0) | 2017.12.13 |
| 선교 한다며...'사무장 병원' 징역 3년 (0) | 2017.12.09 |
| 입원약정서 진료비 연대보증 없어지나? (0) |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