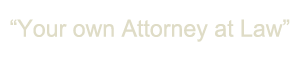위임범위 벗어나는 시행령 효력 살펴봐야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만 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요양병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당직 의료인으로 어떤 의료인을 세우고, 얼마의 인원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 명확치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양병원 원장 A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사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원장은 “의료법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료법시행령에서 병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를 정하고는 있지만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상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의료법에 당직 배치 숫자를 명시하거나 시행령, 규칙 등에 하위규정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어야 죄형 법정주의에 합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당직의를 배치해야한다”는 일반 내용에 따르면 본인은 무죄라고 A씨는 법원에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직’이라는 단어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의료법 제41조 취지에 비춰봤을 때 병원 외부에 있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은 “의료법 조항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에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에 둬야할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도 이를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데도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임의로 규정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법 90조에 의해 처벌이 되도록 형사 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2016년 6월 20일부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대신 의료법 41조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의원입법으로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0) | 2017.07.13 |
|---|---|
|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바뀐 당직의료인 규정 인지해야 (0) | 2017.07.04 |
| 일반진단서‧진료기록영상 CD 발급 수수료 상한 1만원으로 (0) | 2017.06.27 |
| 초보 약사 당황시키는 대체조제·약화사고 대처법은? (0) | 2017.06.15 |
| 병원 안내데스크 있어도 약국 개설 가능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