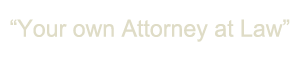대법원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다시 확인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 및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 산정하면 A씨가 지급한 임금은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법리는 대법원이 2007년 1월에도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1,2심과 마찬가지 이유로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가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는 같을 수 없다"고 판시해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365÷7)÷12월≒174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20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산정하면 최저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급은 노동부 기준에 비해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해당 년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은 노동부 기준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셈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주휴시간을 포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언제쯤 정리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인 방송 후원금 100만원 제한, 크리에이터 열풍에 찬물 (0) | 2018.12.02 |
|---|---|
| 가수의 불성실 공연논란...손해배상 해야할까? (0) | 2018.11.14 |
| 오디션 프로그램 1위..아이돌 데뷔는 무산, 손해배상 가능할까 (0) | 2018.11.09 |
| 물 새고 벽 금 갔는데...잔금 줘야 할까 (0) | 2018.11.04 |
| 상속 주식 가치 떨어지만 상속세 환급 될까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