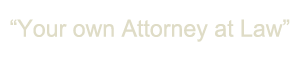대법원
"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B씨는 이 규정에 따라 자동해임 됐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사측의 대기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으나 대기처분 등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B씨가 징계규정에 따른 해임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징계처분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면 이 존속에 대한 효과로 해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은 유지해 B씨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다만 대기처분과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은 별개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대기처분을 받은 후 회사 규정에 따라 대기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해임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 자동해임 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자동해임 처분이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해 자동해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답니다.
즉, 자동해임은 별개의 처분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징계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고 컴퓨터에 깔린 서체,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0) | 2018.07.04 |
|---|---|
| 업무중 다쳐 인대 파열된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0) | 2018.06.24 |
| 제약회사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 부상, 업무상 재해 (0) | 2018.06.14 |
| 불법웹툰 '밤토끼' 구속...3500만명의 접속자는? (0) | 2018.05.25 |
| 법원 "쿠팡 '로켓배송'...운송사업 아니다" (0) | 2018.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