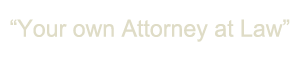생후 3일 만에 아들 숨져...의료진 50% 배상
임신 기간에 진찰을 하면서 엄마 뱃속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산모 ㄱ씨는 2014년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같은해 8월부터 ㄴ산부인과에서 정기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20주차인 그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ㄱ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1월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두 차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임신 34주차인 2015년 3월 7일과 37주차인 27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는 등 특별한 소견은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ㄱ씨는 2015년 4월 15일 새벽 3시 진통을 느꼈습니다. ㄴ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15분만에 3.32kg의 남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창백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의료진은 앰부(Air Mask Bag Unit)를 이용한 수동식 산소호흡과 마사지를 했습니다. 새벽4시 40분 산소포화도가 지속해서 나빠졌습니다. 기관 내 삽입을 통한 산소홉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30분후 119를 불러 인근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찍은 아기의 X-ray 에는 간은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습니다. 탈장된 쪽의 폐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기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 지 사흘만인 18일 '선천성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출산 전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친 진찰을 했음에도 아기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진이다. 초음파 등으로 진단이 가능함에도 진찰을 소홀히 했다. 아기가 횡격막 탈장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기도삽관을 통한 호흡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ㄱ씨 등 유족은 ㄴ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ㄱ씨 아기에 대한 산전 진단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과 위장이 같은 횡단면에서 보인다거나 복강 내에서 위가 보이지 않았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 의심 진단 소견이 타나타지 않았다. 복부함몰 등의 소견이 없어 호흡부전의 증상만으로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없었다"
ㄴ산부인과는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ㄴ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은 ㄱ씨에게 1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음파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고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과실로 선천성 횡격막탈장의 진단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며 “ㄱ씨가 임신한 지 37주째인 2015년 3월 초음파검사에서 복부 둘레나 심장 측정 영상이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과 차이가 나 의료진은 횡격막 탈장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숨진 ㄱ씨의 아기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의 책임을 50%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기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3자들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진료를 하는 의사분들은 가급적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하고, 갑작스럽게 의료사고를 당하게 된 환자는 먼저 진료기록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섞어 만든 당뇨환은 불법 (0) | 2017.10.14 |
|---|---|
| 간호조무사 광선치료, 한의사 책임? (0) | 2017.10.13 |
| 응급실 폭력사용 죄질 좋지 않아..징역형 (0) | 2017.09.28 |
| 2300만원 챙겼다가 1억1800만원 과징금 처분받은 요양병원...영양사 "상근" 이란 (0) | 2017.09.25 |
| 한달 20만원, 제품설명회 식음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리베이트일까 (0) | 2017.09.20 |